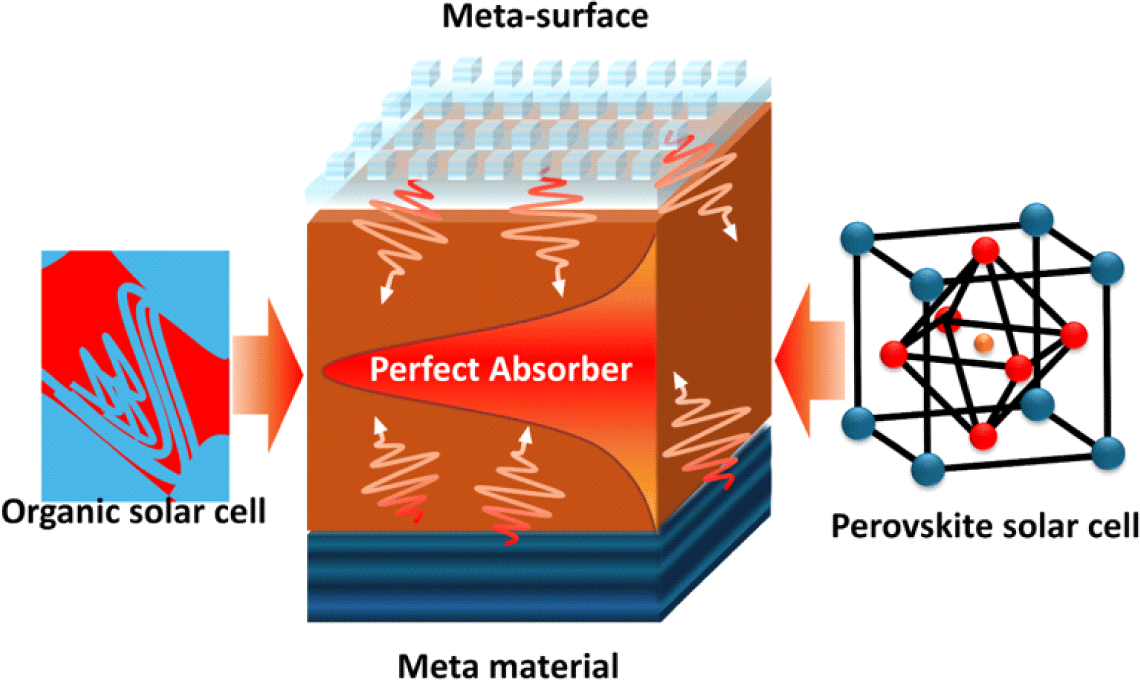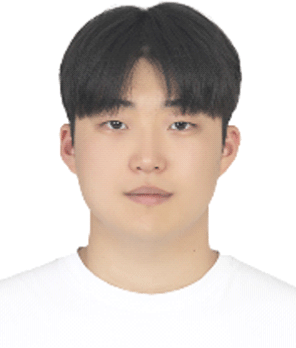1. 서론
용액 공정 기반의 차세대 광전 소자가 발전함에 따라, 이미 고도로 최적화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자 및 재료 단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광전변환효율(power convertsion efficiency, PCE) 26.7%로 인증되어, 기존의 단일접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26.1%를 넘어섰다[1]. 또한, 양자점(quantum dots, QD)과 유기 태양전지도 19% 이상의 PCE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어, 이들 재료의 효율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2,3].
태양전지가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게 하거나 소자 내에서 광 경로를 확장하는 등의 광학적 처리는 소자 및 재료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확장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진다. 먼저, 반사 방지(anti-reflection) 코팅 전략은 특정 굴절률을 가진 재료를 태양전지의 표면에 적용하고, 그 두께를 빛의 4분의 1 파장으로 조절함으로써 광학적 간섭을 최적화한다[4-7]. 이러한 간섭의 조절은 빛이 코팅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파동들이 서로 상쇄되어 반사를 감소시키고, 태양전지로 더 많은 빛이 진입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 다른 전략으로, 광 트래핑(light trapping)은 태양전지 내에서 빛이 더 오래 머물도록 구조적이나 광학적으로 설계하여 빛의 경로를 확장하는 기술이다[8-10]. 이 방식은 태양전지의 뒷면이나 측면에 반사 소재를 적용하거나, 표면을 특정 패턴으로 조각함으로써 빛이 태양전지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반사되도록 하여 빛의 흡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빛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태양전지의 PCE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소재 및 소자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광학적 전략을 다르게 설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적용 시 성능 향상의 한계도 명확하다. 따라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며 더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광학적 전략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구조는 '메타물질(Metamaterial)'이다. 메타물질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에서 유래한 전자기적 특성을 가진 구조나 매질을 지칭한다. 이는 특정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설계된 인공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의 구조체를 의미한다[12]. 자연에서 발견되는 물질로는 광학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나, 메타물질은 빛의 파장보다 작은 구조(sub-wavelength) 활용하여 광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12]. 이를 통해 음의 굴절률을 가진 물질[13], 전자기파를 이용한 특정 물체의 차폐(cloaking system), 초고분해능 렌즈(super lens)[14,15], 특정 파장대를 완전히 흡수하는 메타물질 완전흡수체(metamaterial perfect absorber, MPA)와 같은 새로운 메타물질을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완전 흡수체로 활용되는 MPA는 특정 파장대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흡수율을 보여준다. MPA가 태양전지의 핵심적인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태양전지의 흡수율을 대폭 향상시켜 효율 증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16].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MPA의 적용 사례와 원리를 소개하고, 이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파장 이하(sub-wavelength)의 인공적인 구조 설계를 통해 자연계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메타물질의 광학적 특성은 설계 방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한 흡수 구조에 최적화하여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얇으면서도 100%에 가까운 흡수율을 가지는 메타물질과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다[17-22]. 초기 메타물질 완전 흡수체(metamaterial perfect absorber, MPA) 연구는 주로 회절특성 제어가 용이한 메가헤르츠(MHz)에서 테라헤르츠(THz) 주파수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태양전지의 핵심인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적용은 대역폭과 입사각의 제한으로 실제 태양전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메타물질의 흡수 대역폭은 태양전지가 주로 흡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10%에 불과했으며, 입사각도 주로 수직 방향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까지 대역폭이 개선되고, 편광과 입사각에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차세대 태양전지용 MPA가 보고되고 있다[23].
유기 태양전지(organic solar cells, OSC)는 상보적 흡수를 가지는 유기 도너(donor)와 억셉터(acceptor) 물질을 이종접합 형태의 광활성층으로 제작한 태양전지로, 가볍고 유연하며 지속적으로 효율 증가를 하는 추세이다[24]. 하지만 OSC는 구조적 제한과 상대적으로 얇은 물질 두께로 인해 흡수 효율이 제한되며, 이는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PA를 적용하면, 100%에 가까운 광 흡수율과 다양한 파장대에서의 높은 양자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MPA는 설계에 따라 얇고 유연하게 제작이 가능하여 기능성 OSC와의 통합이 용이하고 다양한 광원 조건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는 유기 태양전지의 효율과 기능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응용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5년 Chen Zhang 등은 OSC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g. 1(a)와 같이 주기적인 금속-폴리머-금속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 자기 MPA를 적용하여 이전 보고 대비 350∼750 nm의 광대역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최대 흡수율을 7배 강화시켰으며 광 흡수의 최대 향상 계수도 최대 6.2까지 증가했다. 또한, 입사각에 의존하여 성능이 달라지는 특성을 수직 입사에서 더 넓은 70° 이상의 입사각 범위에서 균일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하였다[25](Fig.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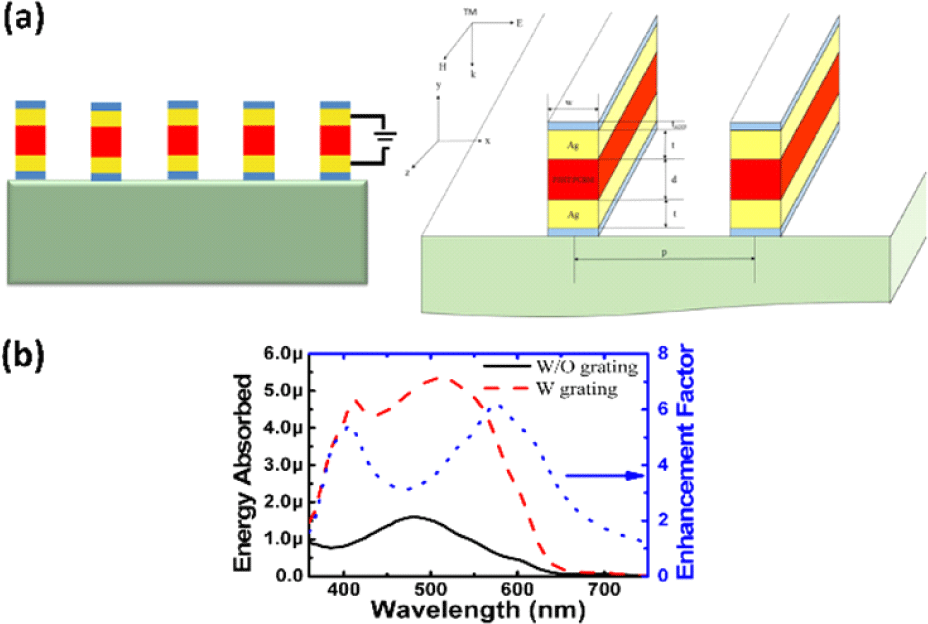
유한요소 시뮬레이션(COMSOL Multiphysics) 기반의 분석결과, 대부분의 에너지는 상단 금속과 유기층 계면 주변에 국한된다. 이는 메타 물질에서 국소화 된 표면 플라즈몬 효과(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때문이다(Fig. 2). 입사된 빛은 주기적으로 배열된 금속 메타물질에 의한 공명으로 인해 유기 활성층에 효과적으로 빛을 가둠으로써 흡수율을 증폭시킬 수 있게 된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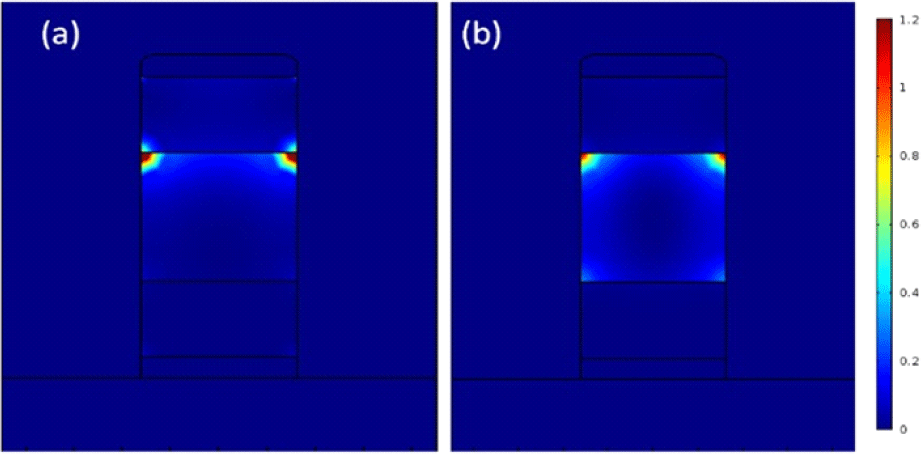
한편, MPA를 OSC의 금속 전극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 이외에도 금속 메타물질 기반의 완전 후방 반사체(perfect back reflector, PBR)를 적용시켜 위상 변조 특성을 통해 OSC의 광 흡수율을 증폭시킨 보고도 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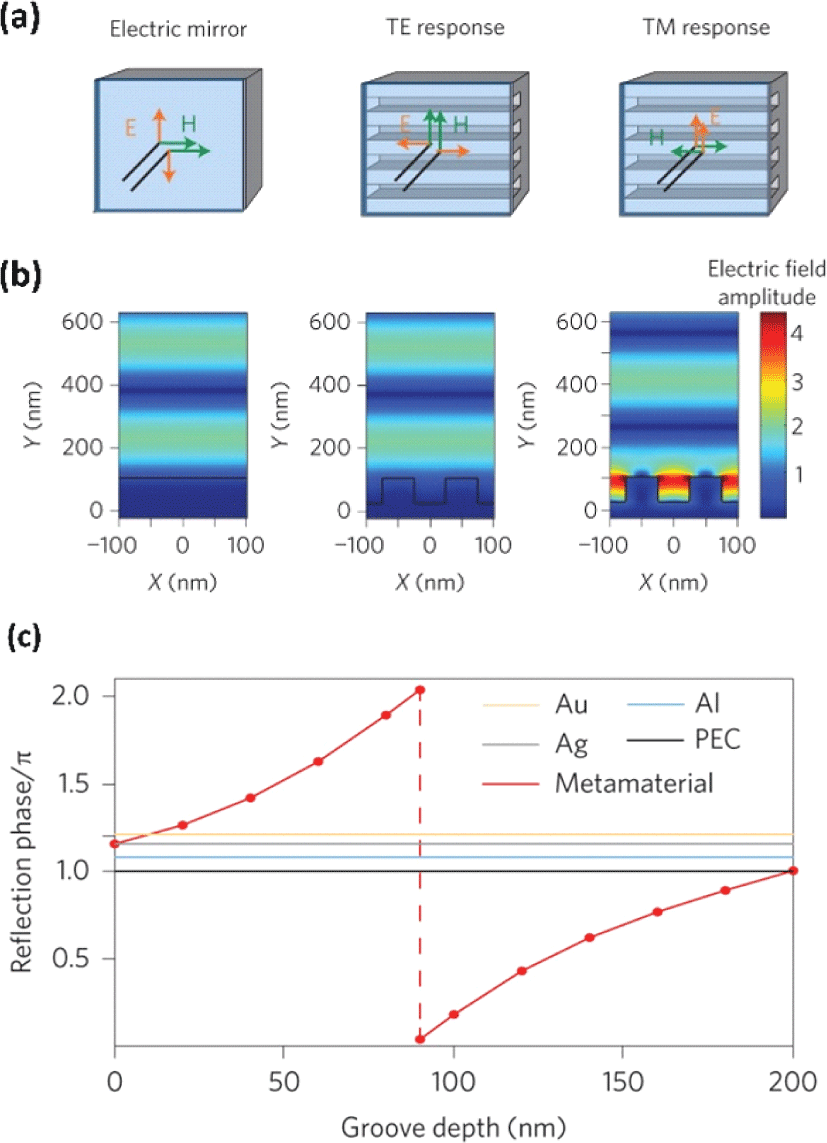
2014년, Majid Esfandyarpour 등은 가시 광선 스펙트럼 범위에서 작동하는 광전자 장치에 메타물질 기반PBR을 적용했을 때 흡수율이 기존 소자보다 강화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Transverse magnetic(TM) 모드의 빛이 메타물질 기반 금속 격자 구조로 입사할 때 gap surface plasmon polariton(gap SPP) 모드가 형성되고, 이 모드가 다시 빛으로 반사되면서 입사하는 빛과 간섭을 일으킨다. 저자는 이 간섭에 의해 결정되는 반사파의 위상이 격자 깊이 조절을 통해 변조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 원리를 활용하여 반사파의 위상을 0°로 조정함으로써 입사파와 반사파가 PBR의 표면에서 보강간섭을 일으키도록 제어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장이 얇은 광 활성층에 집중되면서 광 흡수율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브래그 산란을 통해 입사광의 방향 및 광경로를 제어하는 기존의 광 트래핑 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광전자 장치의 광흡수를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광 기반 소자에 적용 가능한 메타물질 기반 기술이다[26].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활성층으로 결정 구조화된 하이브리드 유-무기 납 또는 주석 할라이드계 물질을 포함한다. 이들은 ABX3 (A: 유기 양이온, B: 금속 양이온, X: 할라이드 음이온)의 화학식을 따르며, 특히, 납 기반 페로브스카이트는 1.5∼1.6e V의 밴드 갭을 가지고 있어[27] 태양전지의 흡광 물질로 특히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Fig. 4(a)). 이 태양전지의 구조는 전자 수송층(electron transporting layer, ETL),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 정공 수송층(hole transporting layer, HTL)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4(b)). 페로브스카이트는 뛰어난 흡광 특성과 빠른 전하 운반 능력을 지녀 광전 소자의 성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물질은 높은 광효율과 비용 효율적인 제조 과정 덕분에 상업적 태양전지로의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 가능한 밴드 갭을 통해 다양한 광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환경과 응용에 맞춰 효율적인 에너지 수확을 가능하게 한다[28]. 이러한 우수한 광전기적 특성 덕분에 단일접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최근 26.7%의 높은 효율을 달성하며 재료의 한계 효율에 접근하고 있다.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소자 및 재료 외부적인 광학적 전략이 필요한데, 메타물질 완전 흡수체(metamaterial perfect absorber, MPA)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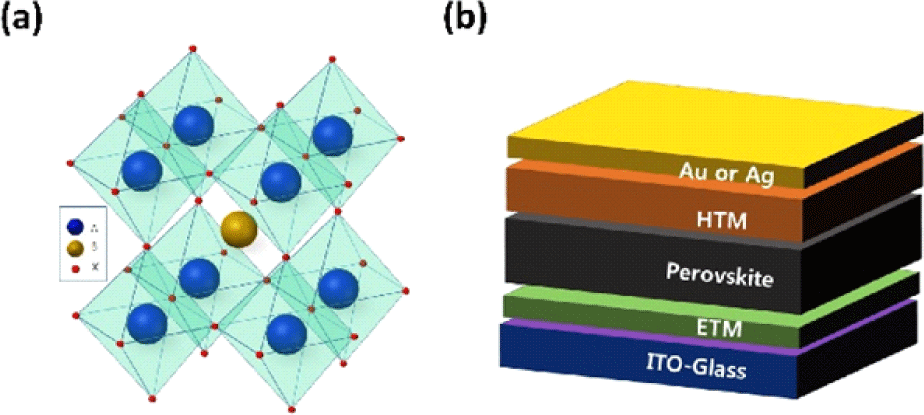
2016년, Albert Lin 등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고분자 기반 MPA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대면적 생산이 가능한 나노임프린트(nano imprint) 공정을 사용하여 고분자 메타물질을 패터닝하고(Fig. 5) 소자의 하단에 집적하였다. 일반적으로 태양전지에 적용되는 메타 격자구조는 광활성층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간섭 효과를 통해 흡수층의 흡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Fig. 3). 반면, 이 연구에서는 소자내의 전기적 특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자 외부의 하단 배치하여 수광부 선단에서 소자 내부의 흡수율을 증폭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하였다[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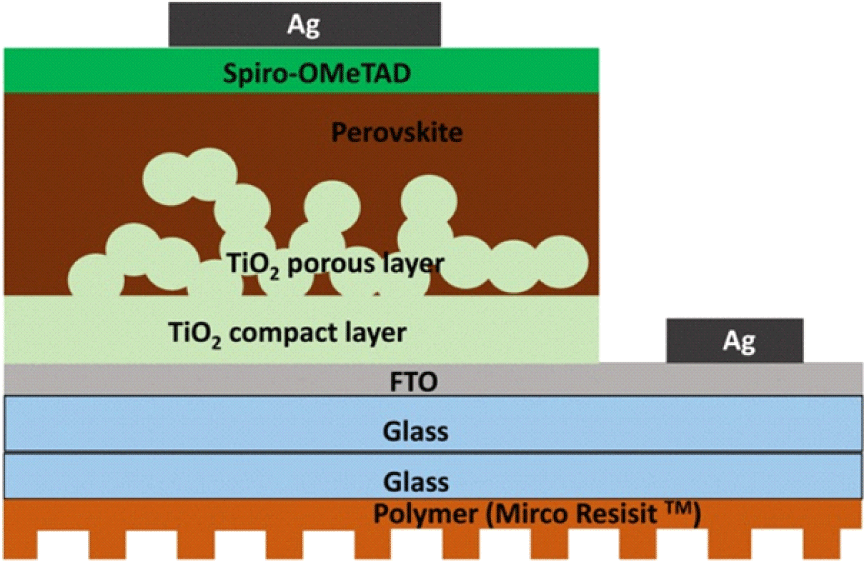
사용된 MPA구조는 카이럴(chiral)과 육방형(hexagonal) 기반의 메타물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Fig. 6(a) 및 Fig. 6(b)). Chiral 메타물질은 주기적인 나선 비대칭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는 강한 광학적 커플링과 광의 탈출을 방지하는 특성을 지녀 효과적인 광 증폭에 기여한다. 이러한 특성은 태양전지에서 빛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Fig. 6(a)). 한편, hexagonal 메타물질은 광 상태 밀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구조는 태양전지 내에서 빛의 경로를 최적화하여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빛이 태양전지 소재 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광학적 효율을 개선한다(Fig. 6(b)). Hexagonal 배열은 또한 빛의 입사 각도에 따른 흡수 효율의 변화를 줄여, 다양한 광원 조건 하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 두 종류의 메타물질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태양전지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통합적으로 사용될 때 태양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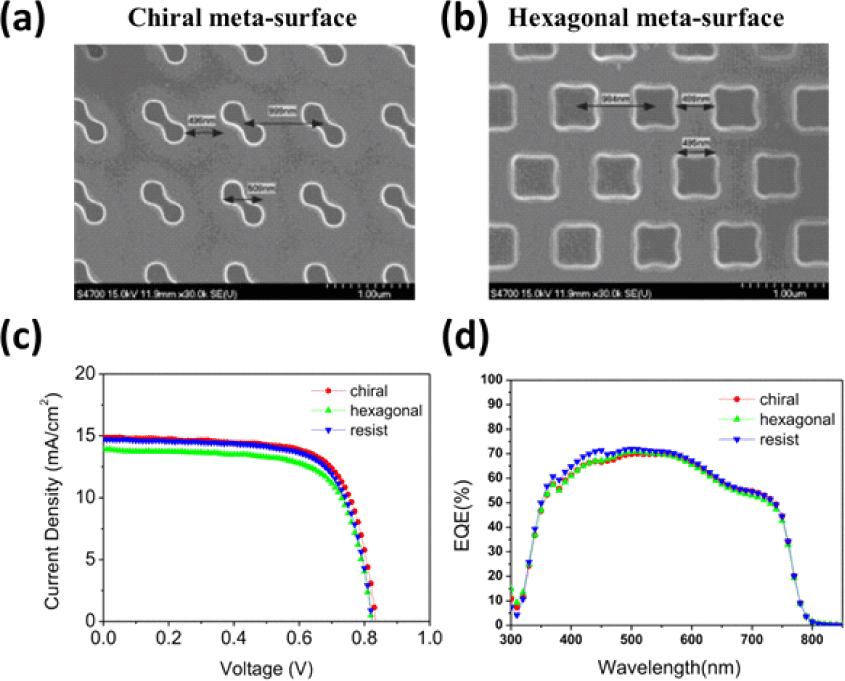
Fig. 6(c) 및 Fig. 6(d)와 Table 1은 MPA를 적용하여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류-전압 특성(J−V),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스팩트럼, 그리고 각 소자별 광전 성능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플라즈모닉 기반 전략의 경우, 흡수 증가를 위해 플라즈몬 표면을 흡수층 근처 또는 내부에 배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특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흡수층이 아닌 소자 최하단에 MPA를 집적하였다. 분석 결과, hexagonal MPA의 경우에는 대조군 소자에 비해 EQE 및 단락 전류(short circuit current, JSC) 손실이 관찰되었지만, Chiral MPA 적용 결과, 350 nm에서 500 nm 범위에서 EQE가 소폭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광전류 및 전체 효율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 시뮬레이션 기반의 MPA 광전 소자 집적 효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대비해, 실험적으로 입증된 최초의 MPA 가능성을 보고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된 MPA 패턴의 깊이는 160 nm로 얇게 제작되어 근접장 효과에는 적합하지만, 소자 최하단에 적용되어 원거리장 효과를 통한 흡수 강화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29].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소자 설계와 MPA 패턴 설계를 최적화하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Baseline | Chiral | Hexagonal | |
|---|---|---|---|
| VOC (V) | 0.82 | 0.83 | 0.82 |
| JSC (mA/cm2) | 14.70 | 14.86 | 13.88 |
| FF (%) | 70.41 | 70.58 | 69.93 |
| PCE (%) | 8.53 | 8.76 | 7.98 |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29]. Copyright 2016, IEEE.
3. 결론 및 전망
광전 소자의 확장적인 성능 향상 전략으로, 메타물질 완전 흡수체(metamaterial perfect absorber, MPA) 연구가 제시되며, 메타물질을 유기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차세대 태양전지에 적용하여 광 흡수율을 향상시킨 최근 연구들이 소개됐다. 유기태양전지에 적용된 MPA는 금속-고분자-금속의 샌드위치 구조를 활용해 광대역 파장에서 광전류와 양자 효율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기존의 플라즈모닉 기반 소자의 후면 금속 반사판 대신 격자 패턴의 MPA를 적용하여 위상 변조 특성을 통해 광 흡수율을 증가시킨 연구도 보고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적용된 MPA연구에서는 광 흡수에 효과적인 카이랄(chiral) 과 육방형(hexagonal) 두 가지 패턴의 MPA를 고분자로 제작해 소자 최하단 선단 수광부에 집적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소폭의 흡수 증폭 및 성능 증가를 보고하였지만, 메타물질이 집적된 첫 차세대 태양전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MPA 기반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인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결과에 그쳤으며, 실험적으로 적용해 실제 소자의 흡수율이나 외부양자효율을 증가시킨 결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다. 단일 MPA 연구 분야에서도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까지의 대역폭을 아우르는 다양한 설계가 개발되지 않아, 향후 소자 설계 및 메타 패턴 설계관련 연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메타물질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과 맞춤형 설계의 유연성은 태양전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단계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물질 설계와 소자 집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태양전지 효율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